서론
가와사키병은 소아연령에서 후천성 심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병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은 급성 전신 혈관염이다[1]. 가와사키병은 급성 심근 기능부전(acute myocardial dysfunction), 심혈관 허탈(cardiovascular collapse)이나 관상동맥류(coronary artery aneurysm), 관상동맥 혈전증(coronary artery thrombosis), 관상동맥 파열(coronary artery rupture)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2]. 가와사키병의 1차 치료는 고용량의 면역 글로불린(intravenous immunoglobulin, IVIG) 및 아스피린 병합 요법이며, 고용량의 면역글로불린을 치료를 적용한 이후 관상동맥 합병증의 발생률은 23%에서 4%로 급격히 감소하였다[3–5]. 하지만 이중 10%–15%는 1차 면역글로불린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치료 불응 환자의 3%–10%에서 관상동맥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보고된다[6]. 특히 관상동맥 혈전증은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므로 빠른 진단과 급성기 항혈전요법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거대 관상동맥류와 혈전증이 합병된 불응성 가와사키병 사례를 보고하며, 거대 관상동맥류와 혈전증의 감별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증례
25개월 남아가 가와사키병이 의심되어 입원하였다. 이전에 건강했던 환아는 개인의원에서 4일 전부터 발열에 대해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고 2일 전부터는 양측 결막 충혈, 손발 부종, 딸기 혀, 입술의 홍조와 균열을 보여 전원되었다. 환아의 신장은 85 cm, 몸무게는 11 kg였다.
입원 시 활력 증후는 혈압 85/64 mmHg, 심박수 135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8.3 ℃이었다. 환아는 잘 먹지 못하여 처져보였고 신체 진찰에서 상술한 가와사키병의 특징적인 증상 외에 이상 소견은 없었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9,990 /mm3, 혈색소 12.5 g/dL, 혈소판 408,000 /mm3 확인되었고 적혈구 침강속도(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35 mm/h , C-반응단백(C-reactive protein) 25.31 mg/dL (정상 < 0.5 mg/dL)로 증가 소견을 보였다. 임상적으로 완전형(complete) 가와사키병을 진단하고 정맥주사 면역글로불린(IVIG: 2 g/kg/dose)과 아스피린(50 mg/kg/day) 치료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IVIG 투여 종료 36시간 후에도 발열이 지속되어, 입원 4일째 두 번째 IVIG와 함께 정맥주사 스테로이드(intravenous methylprednisolone, 2 mg/kg/day) 치료를 추가하였다. 심초음파 검사에서는 좌측 전하행 관상동맥(left anterior descending coronary, LAD)의 확장(2.3 mm, Z-score 2.02 [7])과 정상 좌측 주 관상동맥(left main coronary artery, LMCA 2.5 mm)과 우측 관상동맥(right coronary artery, RCA 2.08 mm)을 확인하였다. 이후 환아의 발열이 소실되어 경구 스테로이드(prednisolone 2 mg/kg/day)로 전환하였고, 입원 8일째 퇴원하였다.
퇴원 일주일 후 외래에 방문했을 때, 추가적인 발열은 없었으나 환아는 처지는 양상과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심초음파 검사에서 거대 동맥류(giant aneurysm)가 LMCA, LAD, RCA에서 확인되었고 좌측 회선동맥(left circumflex artery, LCx)에서는 작은 동맥류가 확인되었다(Fig. 1). 환아는 다시 입원하였다. 스테로이드 복용 중단 후에 발열이 다시 발생되어 인플릭시맙(infliximab 5 mg/kg)을 투여하였고, 프로프라놀롤(propranolol) 복용도 시작하였다. 혈전 생성 예방을 위해 저 용량의 아스피린과 저분자량 헤파린(low molecular weight heparin, LMWH)의 예방적 용량(prophylaxis dose, 0.5 mg/kg bid)을 병용하였다. 두 번째 입원 3일째 시행한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다. 상대적으로 높고 비대칭적인 T파(hyperacute T wave)와 함께 lead II, III, aVF 유도에서 ST 분절 상승이 관찰되었고, V1, V2, V3에서 ST 분절 하강이 관찰되었다. LCx의 경색(infarction)을 의심하여 추적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다행히 LCx의 혈전(thrombosis)이나 폐색(occlusion)은 없었고 심기능도 정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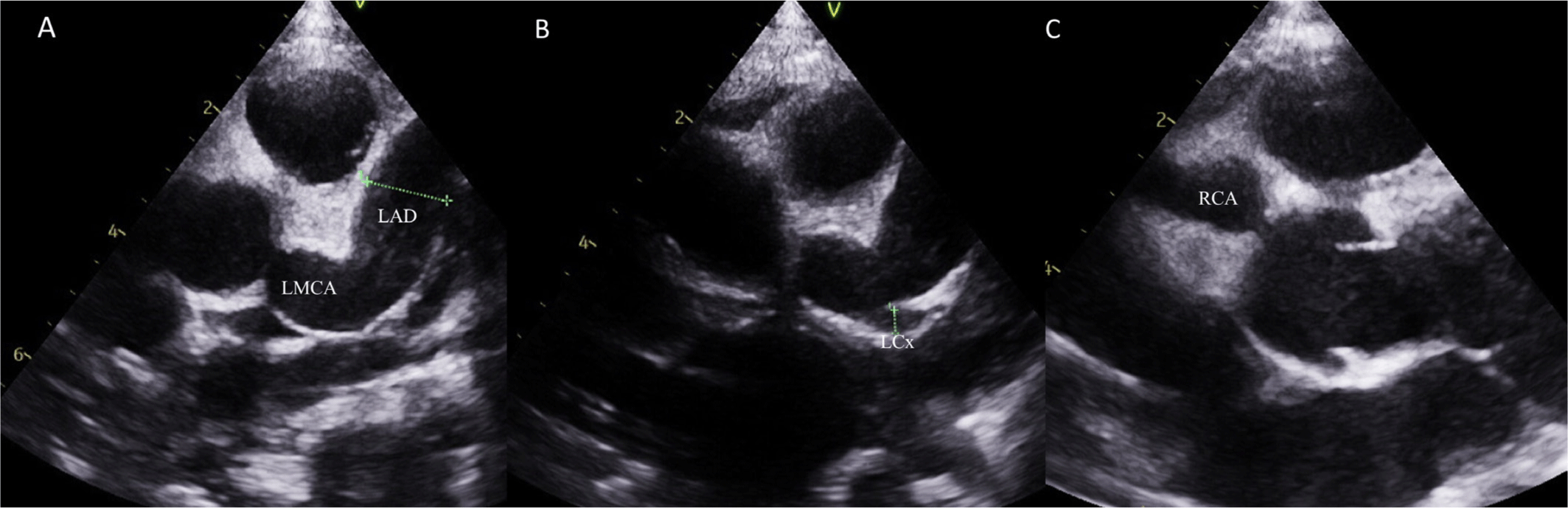
그러나 미세 혈전 생성의 가능성이 있어, LMWH 치료 용량(1 mg/kg bid)으로 증량하였다. 이후에 심전도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입원 17일째 심초음파 검사에서 LAD에서 고에코 소용돌이 흐름(hyperechoic whirling flow)이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Fig. 2). LAD 혈전을 의심하에 LMWH 대신 정맥주사 헤파린 투여를 시작하였다. 혈액 응고 관련검사는 정상 범위(D-dimer 0.38 mg/L, fibrin degradation products 1.6 mcg/mL)으며, 심초음파 검사에서 심근의 국소벽 운동장애는 없이, LAD의 정상 혈류가 확인되었다. 추적 심전도 검사에도 이상 소견은 없었다. 하지만 심초음파 검사에서 지속적인 고에코 소용돌이 흐름이 관찰되었다. 감별을 위해 시행한 심장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rized tomography, CT)에서는 LAD 내에 혈전이 관찰되지 않아 자발 대비 영상(spontaneous echo contrast, SEC)으로 진단하였다. 환아는 와파린(warfarin), 저용량 아스피린 및 프로프라놀론 치료를 유지하며 퇴원하였고, 6개월 추적기간 동안 관상동맥의 혈전의 재발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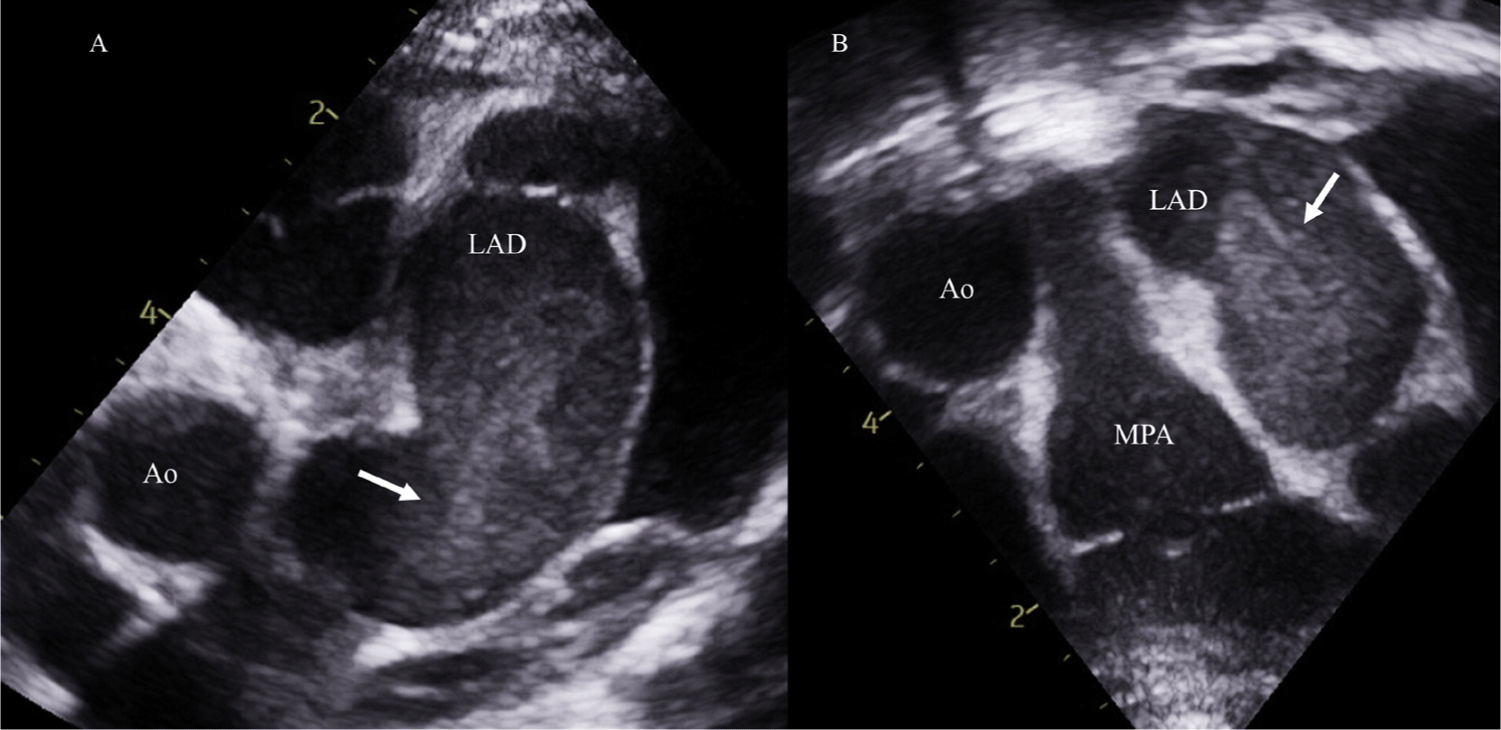
고찰
가와사키병에서 관상동맥 합병증은 가와사키병의 장기 유병률 및 사망률을 높이며 관상동맥 혈전증은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므로 빠른 진단 및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8–10]. 특히 거대 관상동맥류를 가진 환자의 경우 관상동맥 혈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11,12]. 늘어난 관상동맥 내부는 낮은 혈류 속도, 혈류 정체, 와류가 발생하고 혈소판, 응고인자, 혈관 내피 세포의 활성화도 동시에 일어나 혈전 생성을 유발한다[7,8]. 한편 ‘SEC’는 심초음파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혈류 속도가 낮은 심장 내강이나 대혈관 내에서 다양한 밀도의 회오리치는 회색 안개가 보이는 것을 말한다[7]. 이 SEC는 낮은 혈류속도를 일으키는 만성 심방세동(chronic atrial fibrillation), 심근병증(cardiomyopathy), 심실 기능장애(ventricular dysfunction), 대동맥 박리(aortic dissection)와 같은 다양한 질환에서 관찰될 수 있다[13–16]. 또한 fibrinogen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적혈구의 응집이 더 잘 일어나 SEC를 더 잘 관찰할 수 있다[8].
가와사키병에서 발생한 거대 관상동맥류의 경우 낮은 혈류 속도 및 증가된 피브리노겐(fibrinogen)은 SEC 현상을 야기할 수 있어 심초음파 검사에서 초기 혈전과 SEC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과 동시에 어려움이 있다. 심장 CT 및 파종 혈관내 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DIC) 검사, 심초음파 검사에서 국소 벽 운동장애 여부 등 여러 진단 검사를 이용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혈전용해요법(thrombolytic therapy)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